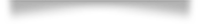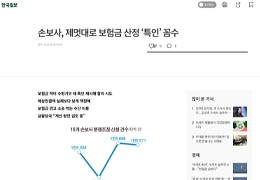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손해보험사는 30대 초반이었던 아내의 사망 배상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했다. A씨가 몇 차례 거부하자 보험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이라며 3억원을 제시했다. 이른바 ‘특인(특별인정)’이었다. 여기에 변호사 및 소송비용 10%를 다시 제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3억5,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2억4,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이었다. A씨는 “최종 판결을 받는 순간 평소 보험사가 유족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특인을 통해 보험금을 멋대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인은 현행 보험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인데, 이를 내세워 보험금을 줄이는 한편, 소송까지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보험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특인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유족이 거부할 때 ‘보험사가 특별히 인정해 주는 금액’이라며 제시하는 보험금이다. 대규모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사망이나 장해 등 대형 사고에서 거의 모든 손보사들이 “소송으로 가면 예상판결액이 이 정도 된다”며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및 소송 비용을 이유로 10~20%를 추가로 제하는 게 보통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판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해 생긴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론 특인이 보험사의 꼼수에 가깝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산출도 자의적인데, 그나마 더 쳐준다며 제시한 예상판결액도 실제 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클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특인은 소비자가 웬만하면 소송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제시하는 보험금”이라며 “결국 보험금을 깎고 소송도 피하려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특인이 남용되는 배경으로 약관상 배상액과 법원 판결액의 간극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망위로금이 대표적이다. 약관상 교통사고 사망자 위로금은 최고 4,500만원이지만, 법원은 1억원까지 인정한다. 금융당국이 연내 이를 8,000만원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자동차 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서 소득을 잃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소득(일실소득) 계산도 차이가 크다. 일실소득은 평소 월수입과 취업가능 월수를 지표화한 라이프니츠 계수표나 호프만 생명표를 곱해 산출한다. 보험사는 라이프니츠 계수표를, 법원은 호프만 생명표를 인정하는데 수치가 높은 쪽은 호프만 생명표다. 월소득도 보험사는 세후소득을, 법원은 세전소득을 인정한다. 장해 사고자의 간병비, 흉터 치료비, 장해 인정률 등에서도 약관과 판결은 격차가 나는데, 보험사가 이런 차이를 특인에 넣을 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그룹인 사고후닷컴 관계자는 “젊고 소득이 많다면 약관상 배상액과 판결액 차이는 수억원에 이른다”며 “판결액이 100이라면 약관은 60, 특인은 80 수준이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손보사의 약관상 배상액이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액과의 차이를 줄일 현실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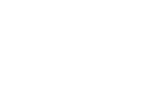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